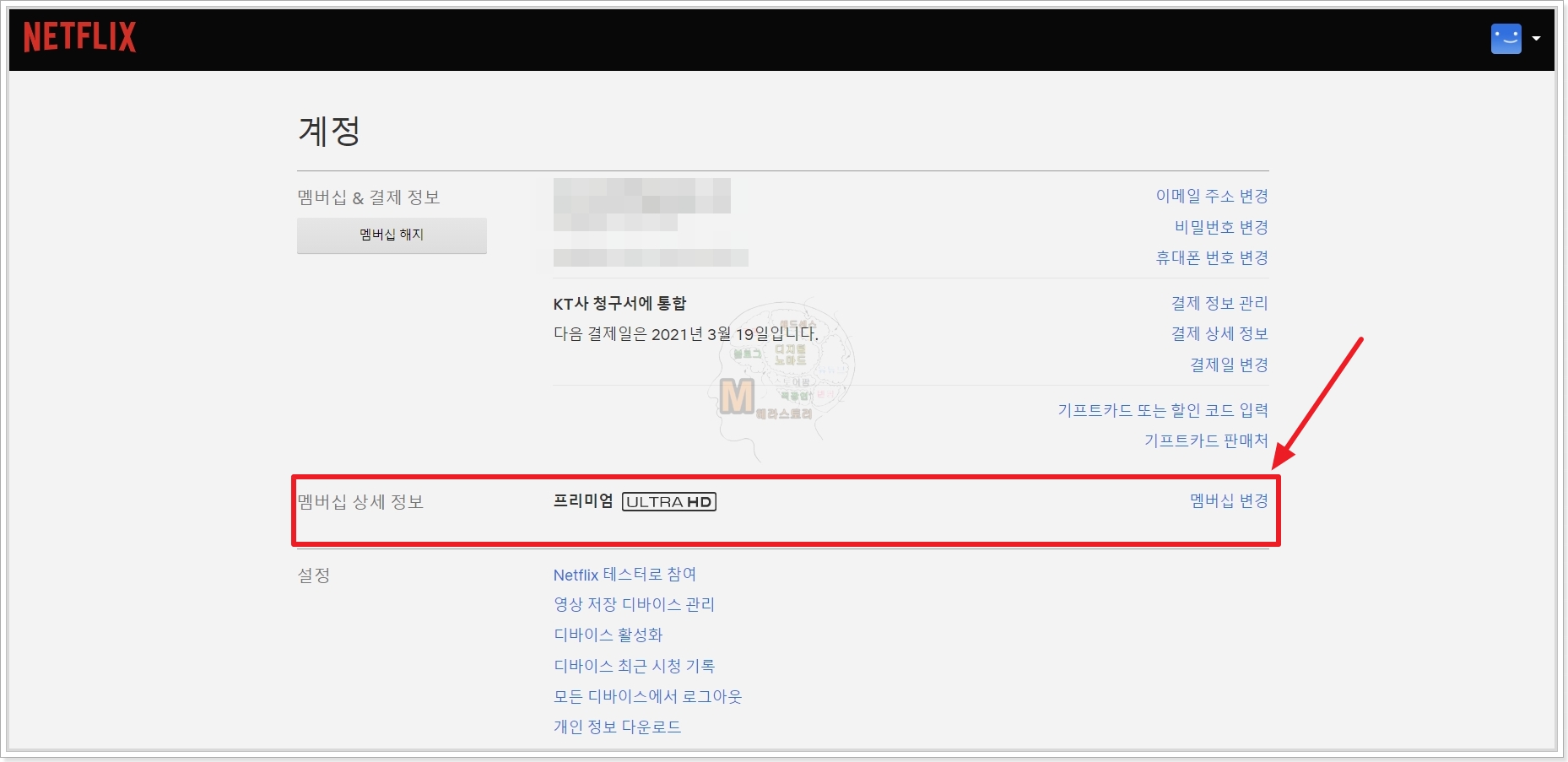분류와 菓 서브 케이크 분류와 菓 서브 케이크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일본 요리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일본 요리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구시당고(구시당고)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구시당고(구시당고)
1. 개요 당고/Dango 일본의 당고. 곡물 가루를 물에 반죽하여 뭉친 후 찌거나 데친 것을 말한다. 콩가루를 묻히거나 간장, 단팥으로 맛을 내기도 하고, 그 중에서도 꼬치로 찔러 만든 꼬치 경단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화과자를 가리키는데, 우리나라의 완자처럼 둥근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고기로 하면 ‘완자’, 흙을 굳히면 ‘흙완자’ 등의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현시점에서는, 일본 국내에서 「단고」라고 하는 이름이 널리 정착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토호쿠에서는 「단스」, 니가타현에서는 「안부」, 시가현이나 시코쿠 지방에서는 「요오루」 등 다른 호칭도 있다. 예로부터 일본에서는 구운 완자나 경단국과 같은 형태로 주식의 대용품으로 먹어 왔고, 재료도 밥을 짓기 어려운 쇄미나 줄기, 잡곡으로는 보리, 밀, 밤, 수수, 기장, 메밀, 옥수수나 팥이나 고구마나 도토리 등을 빻은 가루 등을 사용했다. 오늘날에도 지역에 따라 쌀이 아닌 밀가루나 전분 등으로 만든 완자를 볼 수 있다. 설탕으로 단맛을 낸 경우가 많지만 원래는 보존식이기 때문에 간장으로 간을 하고 설탕을 넣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 단팥이나 콩가루를 바르거나 단팥, 꿀콩 등을 넣어 먹기도 한다. 2. 기원 야나기타 구니오의 신선 중 하나인 토 토기(粢)를 둥글게 만든 것이 원형이라고 한다. 토기는 고대 일본의 미식법의 일종으로, 물에 담근 쌀을 원료로 하여 다양한 모양으로 굳힌 것을 말한다. 열을 이용한 조리법이 아니라 곡식을 물에 담가 부드럽게 만든 다음 이렇게 일정한 모양으로 만들어 신전에 바친 시토기가 경단의 유래가 된다. 「당고」라고 하는 명칭은 헤이안 시대에 쓰여진 「신원락기」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남북조 시대에 쓰여진 「주역서」에는 한자 표기가 같은 「춤」이라는 표기가 등장하고, 거의 같은 시대의 「사석집」이나 「정금오래」에도 이러한 표기가 보인다. 야나기다 구니오에게는 이러한 한자 표기의 명칭이 후세에 이르러서야 유사한 당과자의 명칭으로 적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기술되어 있다. 당과자 중 환희단(歓喜團) 또는 단희(団喜)는 견당사가 가지고 돌아온 인도식 디저트용 만두인 ‘모닥(Modak)’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 이름은 환희천에 바치는 것에서 기인한다. 헤이안 시대의 끝에서 가마쿠라 시대의 끝에 이르기까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요리책 「충지루이키」에서는 이 환희단을 시토기에 빗대어 소개하고 있는데, 이를 보고 그 저서에서 가리키는 환희단이 현시점의 당고에 가깝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무로마치 시대에 이르러 ‘경단’이라고 읽게 되면서 대꼬챙이에 꽂은 것이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우츠노미야 고개의 히가시당고나 교토의 「미타라시당고」가 등장한 것도 이 시기라고 한다. 에도시대가 되어 도시지역이나 길거리에 단맛을 낸 경단이 만들어져 서민의 다과회나 행락에 내는 간식으로도 애용되었다. 반면 농촌 지역에서는 주식 대용품이나 비상식량으로도 먹는 등 다른 의미를 가지기도 했다. 3. 종류 1. 개요 당고/Dango 일본의 당고. 곡물 가루를 물에 반죽하여 뭉친 후 찌거나 데친 것을 말한다. 콩가루를 묻히거나 간장, 단팥으로 맛을 내기도 하고, 그 중에서도 꼬치로 찔러 만든 꼬치 경단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화과자를 가리키는데, 우리나라의 완자처럼 둥근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고기로 하면 ‘완자’, 흙을 굳히면 ‘흙완자’ 등의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현시점에서는, 일본 국내에서 「단고」라고 하는 이름이 널리 정착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토호쿠에서는 「단스」, 니가타현에서는 「안부」, 시가현이나 시코쿠 지방에서는 「요오루」 등 다른 호칭도 있다. 예로부터 일본에서는 구운 완자나 경단국과 같은 형태로 주식의 대용품으로 먹어 왔고, 재료도 밥을 짓기 어려운 쇄미나 줄기, 잡곡으로는 보리, 밀, 밤, 수수, 기장, 메밀, 옥수수나 팥이나 고구마나 도토리 등을 빻은 가루 등을 사용했다. 오늘날에도 지역에 따라 쌀이 아닌 밀가루나 전분 등으로 만든 완자를 볼 수 있다. 설탕으로 단맛을 낸 경우가 많지만 원래는 보존식이기 때문에 간장으로 간을 하고 설탕을 넣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 단팥이나 콩가루를 바르거나 단팥, 꿀콩 등을 넣어 먹기도 한다. 2. 기원 야나기타 구니오의 신선 중 하나인 토 토기(粢)를 둥글게 만든 것이 원형이라고 한다. 토기는 고대 일본의 미식법의 일종으로, 물에 담근 쌀을 원료로 하여 다양한 모양으로 굳힌 것을 말한다. 열을 이용한 조리법이 아니라 곡식을 물에 담가 부드럽게 만든 다음 이렇게 일정한 모양으로 만들어 신전에 바친 시토기가 경단의 유래가 된다. 「당고」라고 하는 명칭은 헤이안 시대에 쓰여진 「신원락기」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남북조 시대에 쓰여진 「주역서」에는 한자 표기가 같은 「춤」이라는 표기가 등장하고, 거의 같은 시대의 「사석집」이나 「정금오래」에도 이러한 표기가 보인다. 야나기다 구니오에게는 이러한 한자 표기의 명칭이 후세에 이르러서야 유사한 당과자의 명칭으로 적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기술되어 있다. 당과자 중 환희단(歓喜團) 또는 단희(団喜)는 견당사가 가지고 돌아온 인도식 디저트용 만두인 ‘모닥(Modak)’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 이름은 환희천에 바치는 것에서 기인한다. 헤이안 시대의 끝에서 가마쿠라 시대의 끝에 이르기까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요리책 「충지루이키」에서는 이 환희단을 시토기에 빗대어 소개하고 있는데, 이를 보고 그 저서에서 가리키는 환희단이 현시점의 당고에 가깝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무로마치 시대에 이르러 ‘경단’이라고 읽게 되면서 대꼬챙이에 꽂은 것이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우츠노미야 고개의 히가시당고나 교토의 「미타라시당고」가 등장한 것도 이 시기라고 한다. 에도시대가 되어 도시지역이나 길거리에 단맛을 낸 경단이 만들어져 서민의 다과회나 행락에 내는 간식으로도 애용되었다. 반면 농촌 지역에서는 주식 대용품이나 비상식량으로도 먹는 등 다른 의미를 가지기도 했다. 3. 종류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쑥당고 미타라시당고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쑥당고 미타라시당고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하나미당고 달맞이당고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하나미당고 달맞이당고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팥소와 콩가루를 바른 완자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팥소와 콩가루를 바른 완자

![[동탄수학학원] 장화 신은 고양이 봤어요 (스포다수 포함) [동탄수학학원] 장화 신은 고양이 봤어요 (스포다수 포함)](https://cdn.lecturernews.com/news/photo/202210/108683_341399_5117.png)